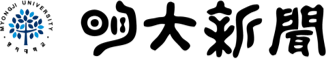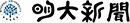강아지만 보면 도망다니기 바빴던 어린 시절이 무색하게도 필자는 지금 강아지 두 마리와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란 걸 비로소 느끼게 됐다. 하지만 그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돈이다. 강아지 한 마리에 드는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료, 배변 패드, 매달 접종 등과 같은 고정 비용은 월 10만 원 이상이 기본이며, 조금이라도 아플 때 드는 병원비 같은 변동 비용은 정말이지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강아지는 아직 2살이 채 되지 않았다. 어린 강아지가 맞아야 하는 각종 접종부터 크고 작은 사고를 겪어 병원을 자주 다녀서 벌써 지불한 비용만 수십만 원이다.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의 입장에선 저렴한 보혐료의 동물 공공보험과 동물병원 진료비 균일화의 부재에 의문이 생긴다. 병원비는 어느 정도 평균치에 맞춰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기본 위생 관리’ 항목만 봐도, 같은 동네지만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오천 원인 병원부터 약 3배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 소비자로서 너무 혼란스러웠다. 진료비 수가제로 진료비가 균일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상컨대 동물병원도 일종의 사업장이기에, 제도가 시행될 시 발생될 수 있는 수의사의 경제적 손해 때문일 듯하다.
강아지의 기본 관리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했던 경험이 이번 생활면 기획을 쓰고자 하는 계기가 됐다. 반려동물이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의료비용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 기획의 소재는 여타 보호자에게도 고민거리일 것이다. 이번 생활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펫보험은 사람의 실비보험과 같은데, 이는 보험사에서 감수하는 위험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높다”고 말했다.
‘사람의 건강보험처럼 국가가 담당하는 동물보험은 나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기획은 작성해보니 정말 쉽지 않은 주제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획이 독자로 하여금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의 책임 주체는 비단 보호자만이 아니며, 국가의 책임이 공존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기사였길. 그냥 모든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고 평생 보호자 옆에 있어 주면 안될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