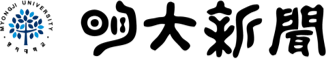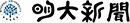봄이 왔다. 누군가에게는 힘든 겨울을 버텨낸 새싹 같은 나날들이, 누군가에게는 아직 동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찌뿌둥한 날들이 펼쳐지고 있다. 어떤 이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고, 어떤 이는 묵묵히 자기가 해왔던 업을 반복해 간다. 신문은 대개 두 가지 모두를 한다. 새로운 기획이 기존의 플랫폼에 그대로 담긴다.
이번 호에서 주목할 것은 ‘서점’ 문제다. 서점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문제와 상업적 문제가 절묘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점의 존재라는 것은 편의를 가져다준다. 편의의 문제뿐 아니라 서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책과 지식 함양의 중요성을 제고시킨다. 자연캠에는 구내서점이 있는데 인문캠에 구내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치부다. 문제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정력에 의해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대내외적 여건이 첫 번째지만 대학 당국의 미진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이 공론을 점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것은 공기(公器)로서의 학보가 이뤄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의 구성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픽이 정돈된 것은 개선점이라고 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학보에 기고되는 외부칼럼이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결이 다른 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외부칼럼은 다양한 의견 풀을 구성하고 색깔을 내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신문의 말미가 아니라 중간에 끼어있어 독자의 흐름을 끊는다는 아쉬움이다. 신문사 내 기자들의 칼럼도 훌륭하다. 그것의 분량을 늘이거나, 가짓수를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외부칼럼을 한데 묶어 문화기획 앞쪽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기사들이 몇 가지 있다. 사실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기사들은 대개 좋은 기사다. 흡연구역 문제를 다룬 기사가 그러하다. 양질의 볼륨을 가진 데이터가 구비됐다.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시각 자료가 이를 보완한다. 일본군 위안부 배상 책임 문제를 다룬 간명한 칼럼은 시의성이 있었고 읽는 내내 문장이 눈에 잘 들어왔다. 기자가 직접 작문하지는 않았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은 주장에 근거와 재기를 더해준다. 학보가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조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실생활에 일어나는 문제는 대개 정치적이다. 우리는 의견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다. 정보의 가치가 있다면 주제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기사가 윤리적이라면 싣는데 주저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