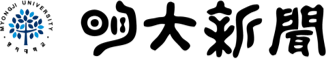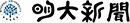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러준 동요들 가운데는 ‘그리운 강남’의 제비, ‘오빠생각’의 뻐꾸기, 뜸부기, 기러기들 울음소리와 슬픈 철새들이 등장했다. 어린 마음에도 제비는 어딘지 모르게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뻐꾸기와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는 어쩐지 마음이 구슬퍼졌다. 1920~30년대, 말 타고 서울로 떠나며 비단구두 사 오겠다던 우리 젊은 오빠들이 오누이와 한 약속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다. 뻐꾸기가 슬피 울던 계절에 말 타고 서울 간 오빠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 되어도 고향에 돌아올 수 없었다. 그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 여름방학이면 나는 곤충과 식물 채집 숙제를 위해 시골에 있는 외가에 가서 여름을 보내곤 했다.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15소년 표류기』, 『로빈슨 크루소』, 『보물섬』, 『알프스 소녀』 등을 읽고, 낮이면 친척 오빠들을 따라 들로 나가 논의 물꼬에서 그물로 물고기도 잡았다. 당시 농촌에서는 주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산골마을 천수답들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샘물이 솟는 웅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이 웅덩이 물을 두레박으로 퍼내면 붕어, 미꾸라지, 뱀장어들이 지천으로 깔려 펄떡거렸다. 그 고기 잡는 그물 안에는 도깨비를 닮은 검은 잠자리 애벌레를 비롯해 올챙이, 피라미, 민물새우들이 함께 우글거렸는데 이들은 모두 웅덩이에 다시 집어넣어 살려주었다. 잠자리 애벌레는 올챙이, 피라미, 민물새우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후에 알았다.
오래된 흑백영화 필름처럼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유년시절 추억의 상념들 가운데 아직 나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선명한 이미지 하나는 초가집 마루 천정에 붙어 있었던 제비집 풍경이다.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면 제비부부의 입에는 곤충먹이가 물려지고 하루 종일 들락날락 분주해진다. 입에 물고 있는 먹이의 대부분은 잠자리였는데, 이때 어미가 물고 있는 잠자리 모습들은 애벌레가 검은 각질의 껍질을 벗고 막 잠자리로 변신한 것들이어서 육질이 부드러워 어린 제비새끼들이 삼키기에 최적의 먹이였던 것이다. 또 다른 먹이는 벼가 자라고 있는 무논에 벼 잎사귀를 먹고 자라는 여름철 들에 넘쳐나는 초록색 메뚜기 등 곤충 종류였다.
우리 농촌은 1980년대로부터 쌀농사 재배방법이 혁신적으로 변경되기 시작했다. 전기 발전량이 증가되면서 시골농촌에도 전기가 보급됨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었음으로 천수답의 샘물웅덩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위쪽 논에서 아래 논으로 내려가는 물의 통로인 잠자리 애벌레의 요람인 물도 사라지
게 되었다. 즉 사계절 웅덩이와 물꼬에 유기적으로 흘러내리던 메커니즘 기능이 정지됨에 따라 웅덩이와 물꼬에 번식하던 올챙이, 송사리, 새우, 붕어, 미꾸라지들이 들녘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이것들을 잡아먹고 자라던 잠자리 애벌레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삼복더위에 어쩌다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릴 때 초가집 추녀 끝에 폭포처럼 억수로 내리던 빗물을 따라 앞마당까지 치고 올라 온 미꾸라지, 송사리들을 개구리들이 달려들어 집어삼키던 초현실적풍경도 사라져갔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삼천리 강산에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면서 전국 방방곡곡의 정답던 모습들의 초가집들도 사라져갔다. 전통적 한국 가옥구조는 초가삼간이 기본구조였는데 가운데 칸의 공간에는 마루를 깔거나 봉당을 그대로 두기도 하였다. 봉당이란 마루가 깔리지 않은 흙면 바닥을 가리킨다. 이 초가삼간 가운데 봉당 칸은 사계절 열려 있는 공간이었음으로 봄에 오는 철새인 제비들이 봉당 천정의 대들보 근처 벽면은 둥지를 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멀리 남쪽 나라에서 한반도에 도착한 제비들은 먼저 검불에 물기 있는 논흙을 이겨서 조금씩 물고 날라 와 대들보 근처 공간에 둥지를 만들었다. 대들보 근처는 빗물이 떨어지는 초가의 처마 끝보다 1m 이상 높게 위치하므로, 비바람에 취약한 진흙과 검불로 빚어진 둥지를 온전히 보존해줄수 있었기 때문에 제비들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 길렀다.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변화로 농촌지역 초가집들이 아파트로 전환되기 시작해 현재는 초가집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혹시 초가삼간의 구조를 가진 집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봉당입구에 유리창문을 설치해 폐쇄된 현대식 건축물로 바뀌고 말았다. 따라서, 정답던 제비들이 보금자리를 지을 공간들은 우리의 삼천리 강산에서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던 계절에 말 타고 서울로 간 오빠들이 낙엽 지는 늦가을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시절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정이월 다가고 봄날이 오면 이 강산에 찾아들던 제비들은 어느 세월에 박의 씨앗을 물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