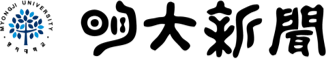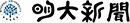사내는 성급히 은지의 허리에 올라타 옷깃을 풀어 제쳤다. 은지의 손톱이 머리통에 박히도록 발악하는 것이 느껴졌다. 침침한 밤하늘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은지의 흰 가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주물 댔다. 이봐, 네 년이 뭐나 된다고. 뭐라고. 머릿속을 휘감는 생소한 감각이 제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오감을 뒤덮고 있었다. 사내가 바지춤을 내리며 은지의 치마폭을 들추어 올리자 귀를 찌르는 계집의 비명소리가 산에 울렸다. 아주 가느다란 짐승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경보음 같기도 한 그 비명소리에 사내는 몸을 떨며 온 몸으로 은지의 얼굴을 짓눌러 숨을 막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 버둥거리던 그녀의 팔다리가 일순 힘없이 늘어져 버렸다. 사내는 그제야 다시 치마폭에 손을 밀어 넣었다. 치마 속은 방금 지린 소변으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달음에 뛰어 집으로 돌아왔다.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 괘씸한 년이. 그년이! 통쾌함이 얼굴을 스치는 강한 바람과 함께 밀려들어왔다. 은지가 다리사이로 흘린 오줌 지린내처럼 죽음은 하찮은 일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방에 들어온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방 한구석에 개어놓고 깊은 잠에 들었다.
촌 동네에 은지 같이 눈에 띄는 계집이 없어졌으니 말이 많았다. 어느 남정네랑 야반도주를 했느니, 누가 잡아갔느니 하는 소문들은 삼일 후 산짐승들에게 뜯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서야 잠잠해졌다. 그러는 동안 사내는 이상할 정도로 대범한 기분이 들어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그 참혹한 시신을 구경 가기도 했다. 아무도 은지의 죽음에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괴팍하고 무뚝뚝한 성미에 무슨 운이 따랐는지, 이듬해에 그는 조용하고 숫기 없는 마을 처녀를 아내로 맞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만큼이나 말이 없었다. 마을 처녀들이 모여 그를 비웃으며 깔깔대고 있을 때에도, 그녀는 함께 웃거나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편이었다. 그가 뭉툭한 손가락을 그녀에게 보이기 싫어 신문지 따위로 채워 넣은 장갑을 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었다.
“불편 할 텐데 벗고 하소. 그리 흉하지도 않더라만…….”
아내는 특별히 다정한 인품은 아니었으나, 남을 욕하거나 못난 점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손가락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남편의 왼손도 끔직스럽게 보는 법이 없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신경질을 참지 못해 화를 내거나 혼자 가슴을 치며 신경질을 부리는 일이 잦았지만 아내에게만은 각별하게 온순하였다.
결혼 후 십년이 지나도록 자식은 생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먹은 고향의 바다가 짠 내를 풍겨내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제 죽은 후 제사상 차려줄 아들은 있지 않아야겠냐며 십년 째 아내를 재촉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은 바다를 뒤로하고 그들 부부는 고향을 떠났다.
그가 새로운 동네에서 얻은 일은 신안의 염전에서 천일염을 만드는 일이었다. 염부 일을 하게 된 그는 태양아래 하루 종일 바다 비린내를 맡아야만 했다. 일은 고단했다. 염전마다 떠놓은 간수는 햇볕이 뜨거운 여름날이 아니면 하루 안에 소금이 오르는 일이 없었다. 행여나 비라도 오면 염전의 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고, 비가 많이 내리면 일이 더더욱 힘들어졌다. 일종의 직업병으로, 그는 갑작스런 비가 내릴 때 더더욱 병적으로 화를 냈다. 육시랄, 망할 놈의 비가 또. 하면서 가슴을 탕탕 쳐 내렸다. 소나기가 내려 미처 옮기지 못한 간수가 비를 맞아버리면 며칠 동안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소금이 언제 오나, 하고 수면에 하얀 소금 꽃이 피어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따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화가 목구멍 위로 솟아오를 듯 치밀어 올랐다. 욕지기를 뱉으며 속으로 그 화를 눌러 삼키면 내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뜨거운 기운에 속이 쓰렸다. 그럴 때면 그는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 날 밤, 하얀 다리사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소변의 지린내와 하찮은 시체를 떠올렸다. 숨을 잃은 사람 몸뚱이란 죽은 생선처럼 비리고 우스운 꼴이었다. 그의 인생 내내 가슴팍을 짓밟고 서있던 그 화가 뻥 뚫려 나가던 그 찰나의 쾌감과 승리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속까지 스미는 이 지긋지긋한 짠 내를 맡고 있노라면, 이따금 그 순간을 멍하니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