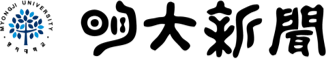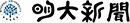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시’도 모르는 것들>
너의 아름다운 수만 가지 이름을 불러줄게
붉은 구름들은 사라진 도시 위에 오래 머물렀다
사라진 도시 위에 밤마다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다
서로의 도시를 침범하지 않은 채
서로의 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새로운 도시 속에서 지느러미를 단 아이들이 태어났다
붉은 구름은 아이들을 녹이지 못했다
그사이 새들이 다시 날아왔고 식물들이 자랐으며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도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붉은 구름이 사라지고 나서도 오래
도시가 사라진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물속은 더없이 맑고 투명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헤엄쳤다
키 큰 나무들이 아이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수만 가지 아름다운 이름들로 불러주었다
-강성은, 「물속의 도시」 부분, 『구두를 신고 잠이 들었다』(창비, 2009)
텅 빈 학교 운동장. 정글짐 위에 앉아 다리를 까닥이며 느리게 흔들리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손을 잡고 내게 머리를 기대왔다. 나는 화답하듯 눈을 감고 낮은 허밍으로 아주 오래 전에 잊어버린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러자 우리 둘 사이에서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
정말로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탄생이었다. 어디서 이 ‘아이’가 왔을까. 어른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나도 ‘아이’인데, 내게 또 다른 ‘아이’가 생긴 것이다. 완전히 낯선 존재. 너무너무 작아서 신기한 아이. 그 작은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 더 놀라운 아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언제 이 아이가 자라느냐는 것이었다. 재보면 보름, 한 달 새에 금방 몸무게가 늘고 키가 크는데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크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고속 촬영 필름을 보듯 내 눈으로도 아이가 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그것까지 다 보고 싶은데. 하지만 아이는 내 눈을 피해서 쑥쑥 잘도 자랐다. 그래서 더 신기했다.
걷게 되고, 곰돌이 인형을 껴안고 까르르 웃고, 엄마ㆍ아빠라는 말을 자유롭게 할 정도의 나이가 되자 아이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꿈을 꾸기는 하였겠지만 말을 못하니 그 꿈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을 배운 뒤로 꿈을 꾸고 나면 새벽에라도 깨어나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응, 가짜 엄마랑 가짜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갔어. 나는 엉엉 울다가 자꾸만 지워졌어. 내가 없어졌어.” 그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물론 말을 하는 내내 아이는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서야 그동안 아이가 자다가 경기 들린 듯 갑자기 울고는 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짐작이 갔다. 품에 안아 토닥이며 등을 쓸어주면 아이는 한참을 더 울다가 겨우 잦아들면서 다시 잠에 빠지고는 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니. 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어…….
강성은의 시를 읽으면 마치 엄마 뱃속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미 세상의 모든 불화를 예감하고 있는 아이의 꿈이라서 이 꿈은 너무나 슬프고 몽롱할 정도로 아리다. 상처를 견디고 밖으로 나가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과 영원히 이 속에서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다는 생각 사이에서 비극은 더욱 깊어만 간다. 인용시를 다시 읽으며 나는 생각한다. 어쩐지 아이들의 꿈은 모두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능력이라도 없으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할 것 같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 낯선 도시가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지느러미를 단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깥의 어떠한 힘도 이 아이들을 해치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세상. 눈을 감아야 보이는 아이들의 마지막 안식처. 그 꿈에는 내 아이의 서러운 꿈도, 내가 아이였을 때 흘렸던 눈물도 모두 들어 있을 것만 같다. 물속에 잠긴 이 도시에서는 정말로 키 큰 나무들이 거대한 잎사귀를 천천히 흔들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을 것만 같다. 간지럽고도 행복하게. 나도 그렇게 내 아이의 꿈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수만 가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이다.
원고매수: 10.6매
필자: 박상수 시인ㆍ문학평론가ㆍ문예창작학과 강사
정리: 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