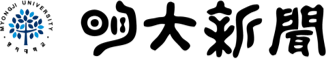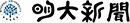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처음에는 어려웠어.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 몇 번 돌아서기도 했거든. 그런데 그 단계만 지나면 되더라고. 그게 어려워.”
6개월 전쯤 술자리를 가진 직장 동기는 내가 회사생활에 대한 고민, 개인적인 아픔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대뜸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 가보길 권했다. 정신과. 왠지 아득해져만 가는 느낌 이었다. “나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 자책도 많이 했고. 그런데 병원을 다니고 상담을 받아보니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찌 할수 없었던 일을 마치 내 잘못처럼 생각했던 것같다’고 말이야. 내가 배운 건 딱 하나야. 우리는 누구나 아픔 하나쯤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그 아픔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라는거 말이야.”
‘속는 셈 치고 가볼까? 아냐, 내가 비정상도 아니고 이 정도 스트레스는 혼자 극복해야지’ 하며 변덕 부리길 며칠 뒤.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 근처의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를 발견했다. 병원은 내가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훨씬더 조용하고, 편안했다. 마치 네가 이곳에 들어온 건 아무 잘못도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질환을 흔히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병은 인류의 역사 만큼이나 오랜 기간 존재했다. 최근에 발견된 문헌에 따르면,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우울증이나 사회 공포증, 성격장애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적대적이었다. 감금과 격리가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보편적인 원칙이었고,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를 두고 ‘몸이 마귀에 점령 당했다’며 손가락질했다.
이런 경향은 ‘이성의 시대’라 불린 18세기까지도 이어졌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사람을 삭발시킨 뒤 기절할 때까지 피를 짜내기 일쑤였고, 속이 다 빌 때까지 관장을 시켰으며, 평소에는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운 뒤 벽에 묶어놨다고 하니 말이다. 간병인은 채찍을 들고 서 있었으며, 심지어 어떤 병원들은 이들의 행동을 돈을 받고 관람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은 ‘환자’가 아닌 조롱거리이자 광대였던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본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19세기의 간호사이자 개혁운동가였던 도로시아 딕스(1802~1887)는 환자들이 수용된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겪고 있는 비상식적인 처우를 기록하고, 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을 통해 이들을 위한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 에밀 크레펠린(1856~1926)은 수천 명의 정신질환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노트에 기록했다. 때로는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면서 병의 예후까지 관찰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끼리 모아놓으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다른 환자에게도 같은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그 환자가 앞으로 어떤 증상을 보일지 예후까지 판단할수 있다.” 정신질환이 더이상 ‘예측불가능’하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이 아니게 된 것이다.
물론 병을 예측하는 방법론이 정립되었다고 해서 병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만들 어진 것은 아니었다. 치료는 실수에 실수를 거듭했다.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1900년대 초, 정신과 의사였던 헨리 코튼(1876~1933)은 장내세균이나 충치가 정신질환을 야기할지 모른다며 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충치를 발치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수술을 받은 환자 79명 중 3분의 1인 23명이 사망했고 말이다. 1920년대에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켜 잠든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장기혼수요법이 유행했으며, 1930년대에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전전두엽에 에탄올을 주사하는 전두엽 절제술이 시행됐다. 진정효과가 뛰어난 클로르프로마진이란 약이 조현병 환자에게 투여된 것은 70년 전인 1953년, 우울증 치료제인 이미프라민이 개발된 것은 1958년이었으며, ‘프로작’으로 더 유명한 치료제 플루옥세틴이 출시된 것은 고작 30여 년 전인 1988년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몇 알의 약이 만들어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언성이 높아진 건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다. “너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상의도 한 번 안하고 이러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퇴근 후집에 돌아온 내게 엄마는 방 한 켠에 두었던 약봉지를 내던지며 소리쳤다.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의 표지에 담긴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내 앞에서 금방이라도 눈물 흘릴 것같은 엄마를 바라보며, 나는, 조금, 아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