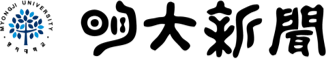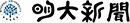3人 3色, 그때 그 시절
명대신문의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다
명대신문이 개강과 동시에 1000호를 맞이한다. 1호부터 1000호까지 6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명대신문사 기자들은 각자의 여건 속에서 자신의 기사들을 써왔다. 그 과정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기도 했다. 본지 기자들은 과거 명대신문에서 학창시절을 바쳤던 기자 3인을 만나봤다.

정인관
명대신문사 4기
시인, 수필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
예술시대작가 회장
은평 문인협회 부회장
전 명지고등학교 교장
Q. 신문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군대 갔다 와서 신문사에 지원하게 됐다. 수습기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다. 처음에 수습기자 기간을 한 학기를 하고 2학년 올라가자마자 3년간 편집장을 맡았다. 아마 내가 제일 오래 편집장을 했을 것이다.
Q. 60년대 신문제작 과정은 어땠나요?
당시 조판할 때는 원고를 들고 읽어가면서 활자를 넣고 뜨거운 불을 아래에 놨었다. 그 위에 쇠를 올리고 쇠 사이에 달걀을 묻힌 한지를 넣고 눌렀다. 그다음 종이에 글자를 찍어 신문을 만든다. 사진을 신문에 넣기 위해서는 사진을 봉지에 넣어서 들고 다녀야 했는데 그 사진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골탕먹이려고 사진을 몰래 숨기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조판할 때 면에 따라 편집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하나 넣는데도 편집하는 기술자들에게 잘해야 예쁘게 편집해줬다. 편집할 때 선 하나에 따라 멋있게 나올지 엉성하게 나올지 정해졌다.
Q. 당시 환경은 어땠나요?
그 당시 환경은 열악했다. 조선일보사나 경향신문사 등 일간신문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신문을 만들어서 보통 오후 7ㆍ8시에 시작하곤 했다. 조판이 대부분 12시 넘어서 끝났는데 통행금지가 있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인숙이나 하숙집에서 잤다. 그 당시에는 여관도 없었다.
Q. 신문을 제작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언제인가요?
신문이 나오면 차에 못 싣고 손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때는 개선장군이 따로 없었다. 학생들이 신문 달라고 하면 나중에 정리하고 주겠다고 무게도 잡고 그랬다. 학생회장 다음이 편집장이었을 만큼 힘이 셌다. 선을 볼 때 편집장 시절 사진을 가져다줬는데 그 사진을 보고 결혼할 정도였다.
Q.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어느 날은 국문과 한 교수님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었다. 신문을 가져와서 다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는데 기사에 달았던 제목에 대해 한 시간 내내 강의하면서 혼내셨고 나는 거의 수업시간에 울다시피 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 교수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한 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방에 있던 조교가 나중에 교수님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뒤에서 욕하고 그랬을 텐데 다르다고 하신 말을 들어서 교수님과 친밀하게 지낸 적도 있었다.
Q. 그 당시 타대학 학보사와의 교류는 있었나요?
당시 일요신문 사장이 김종필 씨였는데 서울 시내에 편집국장을 전부 초대해 언론 정당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그 모임을 통해 팀워크가 생겼다. 또 한 번은 서울 시내의 편집국장을 모아서 기자들 편집 강의가 있었는데 Y 편집, X 편집, 가로 편집, 십자가 편집 등 편집 강의를 통해 친목도 다졌다. 연세대가 가로편집을 처음 시작해 연세대 편집장을 직접 만나서 배워 그때부터 명대신문도 가로편집을 시작했다.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강의를 했을 때 학창시절 뭐든지 자기만의 전문적인 분야를 하나 가지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다. 힘들었지만 편집장을 한 것은 평생의 자랑이고 잊을 수 없고 많이 배웠다. 한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고 뭐든지 해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훈화
명대신문사 6기
청록 라이언스 초대회장, 13대 회장
여가 레크레이션 협회 인천지부 부회장
주부 환경연합 연수구 회장
Q. 신문 제작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인쇄소는 따로 있었다. 요즘처럼 현대화나 자동화가 된 인쇄소가 아니라 철자 인쇄소였다. 무늬 같은 것도 일반 신문에서 직접 오려서 붙여야 편집할 수 있었다. 충정로 근처 허름한 인쇄소에 가서 글자를 뽑았다. 시간이 촉박하면 인쇄소 직원이 아니라 기자들이 판을 만들고 활자를 하나하나 뽑았다.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중앙일보 앞 코리아 헤럴드 있는 근처에서 조판했었는데 시설이 좀 나아졌지만, 그곳도 철자 인쇄소였다. 그리고 지금은 신문이 다 접어 나오지만 그때는 다 수작업이었다. 손으로 하면 아프니까 컵으로 접었다. 자면서까지 접을 정도로 많이 했다. 수습기자 시절 사무실에서는 연탄을 땠다. 수업 없어도 일찍 와서 경비실에서 연탄을 가져다가 땠다. 모든 여건이 안 좋았지만 낭만이 있었다.
Q. 가장 좋았던 기억이나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로 나는 교수님들 원고료를 드렸다. 그럼 교수님들께서 회식하라고 종종 주셨다. 직접 얼굴 보고 드려야 더 재밌는 것 같다. 그 당시 TBC(현 JTBC) 라운지 끝에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지금은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주필 교수를 따라서 들어가곤 했다. 교수님 따라가야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편집하고 야근하면서 순두부 백반이나 짜장면만 먹어도 좋았다. 그때는 참 좋았다.
신문을 가져갈 때 학생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냥 줘도 되지만 학군단이 오면 학생증 가져오라고 유세도 떨고 그랬다.
한 교수님께서는 “학보사에 나오는 거야 공부하러 나오는 거야”라고 하시며 수업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하셨다.
한 번은 여름에 부산을 갔는데 해운대 해변에서 유상근 학장님을 만났다. 그 당시 지성 피부라 여드름이 많이 났었다. 학장님이 보시고 여드름 많이 난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남학생들이 웃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다.
-(2)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