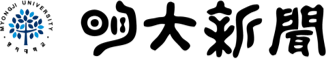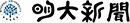우린 하나일까 둘일까
정물화는 형이 몰래 움직여 실패했다
우린 나란히 앉아 닮은 곳을 찾아야 했는데
의자에 앉아
의자 위에 있는 우리를
보는
의자들 의사들
(……)
형과 함께 뱃속에 있었다 생각하니 비좁았다
엄마는 괴물 같은 새끼가 두 개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다
구멍을 나갈 때 순서를 정하는 것 또한 그러했다
우린 충분히 달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만 주목받는 것 같다
그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누워 병신같이 나를 올려 본다
나란히
함께
(……)
모르핀을 맞지 않아도
불을 켜면 자꾸 형이 보인다
-성동혁, 「쌍둥이」 부분
대학 1학년 시절, 방학이면 하루에 비디오 세 편씩을 꼭 보던 때가 있었다. 세 편 선택의 기준은 이랬다. 한 편은 꼭 봐야 한다는 예술영화, 한 편은 오락성이 가미된 최신 영화, 나머지 한 편은 즉흥적인 탐구정신에 입각한 완전 낯선 영화. 워낙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에 무지했던 까닭에 나름대로 마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이었다. 앞의 두 항목을 따라가는 선택은 안전했지만 재미는 덜했다. 세 번째 선택이 늘 흥미로웠다. 실패확률은 높았지만 어쩌다 건지는 의외의 작품이 주는 충격이 있었던 것. 그렇게 만난 작품 중의 하나가 바로 500원짜리 구작을 모아놓는 코너에서 발견한 <베로니카의 이중생활>(키에슬로프스키, 1991)이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당시 이 영화에 관한 아무런 정보없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나 역시 제목이 주는 묘한 성적 뉘앙스(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었을 것이다)에 크게 혹했던 것이 사실이다. ‘훗, 이중생활이라니, 빨리 감기로 밤 부분만 집중 탐구해야겠는걸?’이라고 마음먹고 영화를 보는데, 이건 정말 난해함 그 자체였다. 뭐야? 예술영화였어?! 예술영화는 이미 한 개 봤는데 또 봐야 한다니,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그러나 난해함은 영화가 끝난 뒤 한참 동안의 이상한 정서로 이어졌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세계에 내가 두 명이 존재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던 것 같다. 다른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그의 존재를 모르던 나에게 이처럼 극심한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묻는 듯한 베로니카의 공허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아마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 뒤로 ‘나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오래 생각하게 되었고, 키에슬로프스키의 삼색 시리즈(블루ㆍ화이트ㆍ레드)와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을 챙겨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독의 목록을 늘려갈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자신을 만나는 ‘분신double 모티브’는 문학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소재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한 27살의 신인 성동혁의 시 「쌍둥이」를 읽고 나면, 당연하게도 이들이 ‘쌍둥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고, 동생인 ‘나’는 멀쩡하게 그런 형을 내려다본다. 나의 생명력을 부러워하는 듯이 올려다보는 형. 그런 형을 보며, 슬픔을 꾹꾹 누르고 있는 동생의 말투에는 자신만 멀쩡하다는 죄의식과, 형에 대한 안쓰러움과, 너무 닮아서 ‘자신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듯한 기묘한 상실감’이 가득하다. 정말로 오래 아파서 죽음의 경계를 건너왔다 온 사람만의 격렬함이 내재되어 있어서 시가 애통하고 묵직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시를 세 번 이상 계속 읽어보면, 어쩐지 이들이 둘이 아니라 한 명인 것 같지 않은가? 실은 아픈 시적 화자가 침대에 누워 또 다른 멀쩡한 '형'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멀쩡한 사람이 모르핀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 “모르핀을 맞지 않아도/ 불을 켜면 자꾸 형이 보인다”는 말은 시를 이끌어가는 시적 화자가 바로 ‘환자(형)’임을 알게 해준다. 또 다른 자신, 즉 도플갱어를 본 사람은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속설이 있다. 지금 화자는 멀쩡한 사람으로 상상해낸 ‘동생(또 다른 자신)’의 눈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필자: 박상수 시인ㆍ문학평론가ㆍ문예창작학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