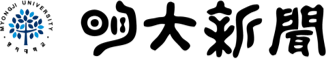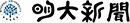요즈음 수업 중에 최대한 쓰지 않으려는 말이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쓰곤 하던 말들, 심지어 쓰면서 약간 자랑스러워 하기도 했던 그런 말들인데도. 이를테면 ‘우리나라’, ‘우리말’과 같은 단어들.
물론 ‘우리’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과 한 울타리(정설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원이 울, 울타리 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기쁘고 편안한 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울타리가 한편으로 우리를 지키고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다들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학교(또 우리라는 말을 쓰고 말았다)에는 이미 다양한 국적과 문화 출신의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 그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다가, 무심결에 ‘우리나라’나 ‘우리말’과 같은 말을 해 버리고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이다. 아차, 저 학생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들에게 속하지 않는구나’, ‘나는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마치 내가 베이징에서 유학하며 수업을 듣던 시절, 중국인 교수님이 ‘워궈我國(우리나라)’ 라고 할 때마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번 상기해야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오해하지 말자. 유학 시절 지도교수님은 대단히 점잖고 합리적인 분이셨고, 당시 함께 공부하던 동료와 친구들도 무척 우호적이었다. 그 시절은 내게 지금도 무척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 시절의 나는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완전한 ‘우리’는 아니었다. 많은 차별과 배제는 이렇게 고의성 없이, 무심결에, 하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우리는 상대의 국적을 전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수업처럼 다국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우리나라’ 대신에 ‘대한민국’, ‘우리말’ 대신에 ‘한국어’라고 말해 보면 어떨까?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굳이 이 먼 곳까지 온 손님들을, 정말로 우리 속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려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노력할 수는 없을까?
사실 출산율이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학령 인구와 노동인구가 무서울 정도로 줄어드는 한국에서, 이런 손님들을 받아들여 ‘다양한 우리’가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계속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른다. 울타리를 높고 튼튼하게 두르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겠지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손짓을 보내는 사람들을 자꾸만 밀어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현상이 최근 자꾸 눈에 띈다. 윤리와 도덕을,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동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종종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든다’ 면서 분노를 터트리는 것이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아니, 이제는 하다못해 ‘우리나라’라는 말도 쓰지 말라는 것이냐” 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분노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적반하장이다. 사람은 배워야 하고, 배움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노예로 삼거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공놀이 결과에 따라 사람의 심장을 꺼내지도 않고, 어린 여성의 발을 꽁꽁 싸매서 기형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법도 충분히 배울 능력이 있다.
물론 사람들의 심사가 각박해지는 것도 이해가 간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취업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을 탓하고, 이미 내 옆에 들어앉은 타인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라면 모를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자랑스러운 명지대학교의 학생이라면, 주변에서 항상 들려오는 낯선 언어와 얼굴에 마음을 여는 법도 배워 보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