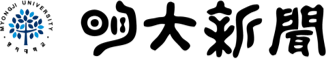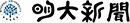1980년대 대학의 학보사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뜻을 모으고 하나로 집결됐던 때가 있다.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온 세상이 떠나가라 분개하고 공감하던 시절, 그때의 학보사는 대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신문을 읽어본 이들보다 안 읽어본 이들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학보사는 유명무실해졌다. 필자는 학보사의 쇠퇴는 인터넷이 발달한 순간부터 예견돼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발달은 대학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내는 종이 신문을 쇠퇴시키는 데 영향을 줬다. 또한, 자극적인 매체를 많이 접해왔던 젊은 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종이 신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보사만이 학교 내 소식을 전달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누구나 학내 소식을 제약 없이 손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SNS)이 구축됐다. 우리는 더 이상 몇 주를 기다리고 기다려 회색 갱지에 있는 수많은 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신문을 들고 학내 관련 기사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 앞에서 키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보사는 학교와는 관계없는 사회 혹은 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를 싣곤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러한 학보를 본 후,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며 흘려버리게 된다. 본지 기사를 읽고 대학의 동아리 활동이 취업활동의 발판이 돼,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학보사와 같은 곳에 관심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필자 또한 더 이상 대학은 배움의 장과는 멀리 떨어지고, 취업의 발판이 되어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학보사는 저널리즘에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학생의 본질인 학업과 병행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본지 기사에 실린 우리 대학 신문의 발간 과정을 보고 적은 인원으로 2주간 12면의 신문을 채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신문이 신속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이 있다면 발행 부수를 줄이고, 다른 매체와 달리 대학신문만이 할 수 있는 교내 정보를 담고 있는 조금 더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보도를 싣는다면 우리 대학 학우들이 명대신문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