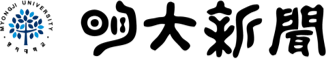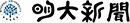1화
사내는 얄팍한 가죽 한 장을 뒤집어 쓴 듯, 왜소하고 작은 남자였다. 항상 내보이기를 꺼려하는 그의 왼손은, 새끼손가락부터 검지까지 네 개의 손가락 모두가 뭉툭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열아홉에 처음 탄 원양어선에서 생긴 상처였다. 배 밑에 낀 그물을 빼러 내려갔다가 스크루에 휘말려 가느다란 손가락 네 개가 싹둑, 잘려나가 버렸다. 어선은 2주가 더 지나고 나서의 뭍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 그의 손가락은 소금기 마를 날 없이 곪아갔다. 뼈마디가 드러난 손가락 위에 앙상한 살이 돋아나 엉겨 붙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사내는 곪은 상처 위로 소독약을 바를 때마다 소주를 마셨다. 때론 소주 값이 없어 가게에서 외상을 받아와야 했고, 가게 주인이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일 때 쯤 해선 여동생의 빈곤한 서랍을 뒤졌다. 그의 삶은 볼썽사납지 않은 데가 없었다.
“병신 같은 새끼. 거따가 손을 왜 드미나?”
평생 배를 탄 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사내에게 늘 병신, 병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아버지의 병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엄지만이 샐쭉하게 홀로 남아있는 그의 왼손은 지느러미 잘린 생선 몸뚱이처럼 꿈틀거렸다. 잘려나간 것은 손가락만은 아니었다. 제 왼손을 주머니에 구겨 넣기 바빠 무엇 하나 내세울 줄을 몰랐고, 뭉툭한 네 개의 손가락처럼 늘상 말꼬리를 툭툭 잘라먹고 내뱉곤 했다. 누구나 그를 손병신이라 불렀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항상 의심했지만, 동네 누가 보기에도 그 괴팍하고 유별난 성미는 피에 새겨진 것이 분명했다. 큰 소리가 나면 귓구멍이 찔리는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항상 눈썹을 일그러트리는 버릇 때문에 미간 사이엔 열아홉 이후로 늘 깊게 파인 주름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들었을 때도 그는 가만히 눈썹을 찡그렸다.
“몸뚱이도 없이 뭔 놈의 장례를 합니까.”
스무 살짜리 신참 선원과 시비가 붙은 아버지는 그를 그물로 묶어버리겠다며 덤벼들었다고 한다. 그 신참이 제 다리를 물어뜯는 아버지의 몸을 번쩍 들어 바다에 던져버린 일은 너무나 순식간이라 대단찮은 죽음도 못되는 것으로 들렸다. 아버지는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다. 병신, 병신…. 그는 아버지의 입버릇을 따라 되뇌어보았다. 바다 어딘가에 넝마가 되어 떠다닐 아버지를 생각하니 우스워졌다. 더 이상 자신이 병신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어보였다. 병신, 하고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었지만 시신조차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는 들을 귀도 없었다. 사내는 그것이 몹시 분하다고 느꼈다. 그제야 여태껏 자신이 화가 나있음을 깨달았다. 미간의 주름은 칼로 새긴 듯 더 선명하게 패여 갔다.
깨닫고 나니 세상은 화를 낼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신도 없이 묘비만 서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심심찮게 침을 뱉었고, 묘비 앞에 어머니가 채워놓은 소주로 목을 축였다. 밥상다리 하나 움켜쥐지 못하는 그의 왼손을 어린 여동생이 비웃자, 왼발은 성하다 이년아, 하며 동생의 가슴팍을 걷어차 버렸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는 나날이 손아귀 힘만 늘어갔다. 매일같이 사내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고 시커멓게 미역이 널려있는 바닷가로 향했다. 동네 처녀건, 할망구건 하여튼 가슴이 솟아나올 나이가 지난 여자들은 죄다 모여 있었다. 바닷일을 업으로 삼는 동네에서 열아홉 이후로 배를 타지 못해 계집들 틈에서 함께 미역이나 널고 있는 그가 사내 취급을 받을 리가 없었다. 게다가 또래의 처녀들은 죄다 깍쟁이라, 손가락이 네 개나 모자라는 사내와는 상종치를 않았다. 질퍽질퍽 팔에 감기는 미역 줄기처럼 그녀들의 짓궂은 농이 감겨왔다.
“아따, 손꾸락 흘리면서 거기까지 떨어져 나갔나. 하는 일마다 시원찮은 것이…….”
처녀들의 입담은 바닷물보다 짜고 걸쭉했다. 속이 끓어왔다. 그는 바다가 싫었다. 이십 년이 넘도록 바다는 익숙해지는 법이 없었다. 날이 좋아 널어놓은 미역들 위로 금세 하얗게 소금이 말라있었다. 종일 피할 수 없는 짠 소금 냄새에 사라진 네 손가락이 괜히 쓰려왔다.
/하경화(문창 05) 학우